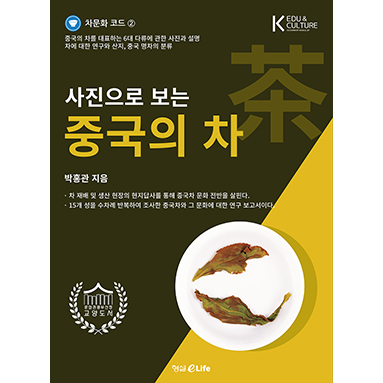홍차나 무이암차에서 완성품 출시 이전에 다양한 공정에서 블렌딩이 이루어진다. 보이차는 처음부터 차 맛을 좋게 하거나 차의 성질에서 서로 보완관계로 맛을 위해 블랜딩하는 올바른 경우와 실제보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등등의 사정으로 눈속임 블랜딩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차꾼들은 이미 완성되어 시판되고 있는 차들을 마실 때도 블랜딩하면 더 깊은 맛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마시기도 한다. 이런 블랜딩은 이미 명대부터 있어왔다. 청대에는 아예 여러 종류의 차를 한 번에 넣고 같이 우려 마시는 다관이 분리되고 물부리가 두 개 혹은 통합된 형상의 다호도 존재한다. 이미 그렇게 마시는 주변의 분들도 꽤 존재한다.
대부분 차성이 비슷한 경우로 중차를 하거나 섞어 마시게 되는데, 숙차는 숙차류대로, 생차는 생차류대로, 향은 마무리에 가미하는 형식으로 화차나 진년귤피 등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그 순서대로 겹치거나 섞이는 것이 숙차와 생차의 조합일 때 묘한 기대를 가지게 된다.
2014년 10월 12일 김경 씨와 늘 일요일이면 만나게 되는 k선생과 함께 오랜만의 찻자리에서 1990년대 7542와 90년대 황인숙차를 함께 자사호에 넣고 우렸다. 우리 세 사람이 모두 농하게 마시는데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랬는지 호에 차가 가득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차 향기는 생차인 7542의 강한 맛이 두드러지고 네 번째 부터는 황인숙차 맛이 더 강하게 나온다. 이런 맛의 결과는 두 차의 조합이겠지만 기본적으로 황인숙차는 다른 차들과 섞어서 마실 때 더 힘을 발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숙차 중에서도 생차와 어울릴 수 있는 차인 황인숙차는 매력이 있다.
강한 7542의 맛이 여려질 무렵 두툼하게 치고 나오는 황인의 중후한 베이스는 생차의 맛을 더욱 살려주면서 부드럽게 완충해준다. 이렇게 마신다면 생차의 강한 맛에 취하면서도 여기에 다른 조합을 구상하게 되는 여유로움까지 더해지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