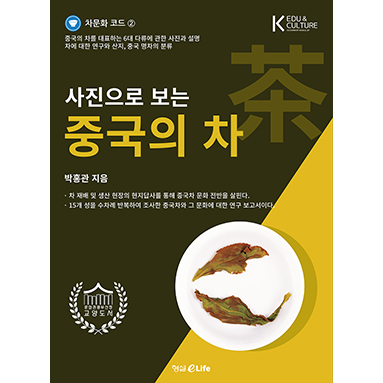이름 : 유동훈(柳東勳)
출생 : 1969년 7월 4일
학력 :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국제차문화학협동과정 석사과정 졸업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국제차문화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졸업
현재 : 국립목포대학교 국제차문화 · 산업연구소 연구원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국제차문화학협동과정 출강
논문 : 茶山 黃茶의 特徵과 傳承 考察 (韓國茶文化 제2집)
文緯世의 茶賦를 통해 본 장흥지역 음다풍속 고찰 - 固形茶를 중심으로 - (韓國 茶文化 제3집)
東醫寶鑑을 통해 본 조선시대 음다풍속 고찰 - 藥用을 중심으로 - (韓國茶文化 제5집)
조선시대 황차(黃茶)의 음용 양상과 전승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시대 文獻에 나타난 茶의 약리적 활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문학박사)
-------------------------------------------------------------------------------------------------
조선시대 文獻에 나타난 茶의 약리적
활용에 관한 연구
유 동 훈
목포대학교 대학원 국제차문화학 협동과정 (지도교수 조 기 정)
<국문초록>
차(茶)는 중국에서 처음 음용되면서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밀접한 위치로 인하여 동시대의 차문화가 직접 전래되었다. 중국 차문화의 영향으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까지는 중국과 유사하게 발전하였지만 조선시대 음다문화는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명대에 들어와서 주원장의 단차폐지령으로 인해 주로 산차를 중심으로 음용되고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동시대였던 조선시대 음다문화는 중국과 달리 산차(散茶)와 고형차(固形茶)가 공존하면서 전개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시대 음다문화에서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특징은 차를 약용으로도 음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조선시대에 저술된 많은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차를 소재로 창작된 시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고형차와 약용으로 음용하는 음다풍속은 조선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조선시대의 특징적인 음다문화를 조선시대에 저술된 문헌을 고찰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중국 명대에 저술된 다서(茶書)를 통해서 제다법과 음다법의 변화를 살펴본 후에 조선시대 차와 관련된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중국 음다문화와 구별되는 조선시대 음다문화의 특징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중국은 명대에 들어와서 초청법(炒靑法)으로 산차가 만들어 지면서 음다법도 산차를 원형 그대로 우려마시는 포차법(泡茶法)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중국과는 달리 여전히 증청법(蒸靑法)으로 고형차가 만들어지고 음용되었다.
조선시대 차를 소재로 한 시문가운데 고형차의 음다풍속을 알 수 있는 시문들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서 고형차의 음다풍속이 성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 후기에는 ‘만불차(萬佛茶)’, ‘죽로차(竹露茶)’, ‘보림백모(寶林白茅)’ 등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고형차들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명대에 들어와서 송대의 점차법(點茶法)이 사라졌지만, 조선시대에는 가례(家禮)에서 차를 올리는 헌다(獻茶)의식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에 고형차의 음다풍속이 여전히 성행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 가례에서 점차하여 차를 올리는 풍속은 오랜 세월동안 지속되었는데, 차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헌다의식에서 끓인 물에 숟가락으로 밥알을 풀어서 올리는 것으로 점차의 형식을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풍속이 오늘날 까지도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헌다의식에서 점차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차를 약용으로 음용하는 음다풍속은 이목(李穆)의 『다부(茶賦)』, 이운해(李運海)의 『부풍향차보(扶風鄕茶譜)』, 이덕리(李德履)의 『기다(記茶)』 등의 다서와 허준(許浚)이 편찬한 『동의보감(東醫寶鑑)』, 그리고 차를 소재로 한 시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기다』에서는 작설차를 약재로 사용하는 것이 풍속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동의보감』의 편찬은 당시 조선에서 재배되고 생산되는 약재인 향약을 백성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동의보감』에서는 향약으로서 차의 활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 차를 복약 · 처방 · 단방 · 외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동의보감』에서 약재로 활용한 차가 고형차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고형차를 약재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고형차의 음다풍속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었기에 고형차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에 차를 약용으로 음용하는 음다풍속이 성행하였던 이유는 차가 약재로 사용될 만큼 약리적인 효능이 뛰어났기 때문이었으며, 국가적으로도 차를 향약으로 인식하고 백성들에게 널리 사용하도록 장려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차의 약리적 활용 사례들을 수집하여 오늘날 과학적인 연구 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효능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선현들은 오랜 시간동안 경험적인 체험을 통해서 차의 약리적인 효능을 체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