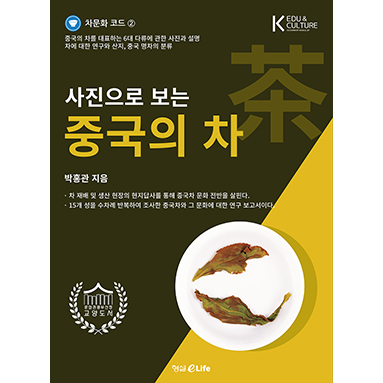세계화 시대를 맞이해 한국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과 한국 문화를 바르고 쉽게 소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 전통문화의 전제 없이 한류 또는 한국 문화의 매력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한 권으로 읽는 전통문화』<티웰>는
예로부터 내려오면서 오늘날까지 정착 된 일상의 생활예절과 차문화를 비롯하여 세시풍속과 통과의례, 민속놀이까지 한국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폭넓고 알기 쉽게 다루면서 우리의 전통문화가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의의도 살펴보았다.
외국인 독자를 위하여 ‘1장 총설’은 영어, 중국어, 일어로 번역하였다. 이 책은 한국문화를 알고자 하는 내외국인이나 한국 전통문화 교육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 문화의 진정한 세계화를 위하여 한국인 스스로 전통을 기반으로 한 우리 문화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저자 서정임
원광대학교 한국문화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다년간 대학에서 문화관련 과목과 유아전통교육을 강의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교육하고 있다.
또한 대구차문화원 원장으로 차와 예절교육에 앞장서며 대구차문화원에서는 전통문화 연구와 더불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전통문화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저자 프로필 http://seoku.com/356
목차
이 책을 내면서
1장. 총설
01. 전통문화의 개념과 의의
1) 전통의 개념과 의의
2) 문화의 개념과 의의
02. 한국 전통문화의 형성 배경
03. 전통 사회와 생활문화
1)가족 생활 문화
2)공동체 생활 문화
3)농업 생활 문화
2장. 예절과 전통문화
01. 예절의 의미와 정신
1) 예절의 형식과 본질
2) 예절의 유래
3) 예절의 정신적 배경
02. 기본 생활 예절
1) 수신 예절
2) 행동 예절
3) 복식 예절
4) 인사 예절
5) 언어 예절
03. 가정생활 예절
1) 가정과 가족
2) 효도와 우애
3) 촌수와 계보
4) 호칭과 지칭
5) 방위와 의식
04. 차생활 예절
1) 차의 이해
2) 차의 역사
3) 차의 정신
4) 차와 문화
5) 차생활의 실제
05. 절기와 세시풍속
1) 세시풍속의 문화적 배경
2) 세시풍속의 기원과 특징
3) 세시풍속의 종류와 내용
4) 세시풍속의 놀이
5) 세시풍속의 전승과 변화
06. 삶과 통과 의례
01) 출산 및 육아 의례
02) 성년 의례
03) 혼인 의례
04) 상장 의례
05) 제사 의례
06) 통과 의례의 문화적 의미
07) 관혼상제의 교육적 의미
07. 한국의 민속놀이
01) 민속놀이의 성격
02) 민속놀이의 범위
03) 민속놀이의 특징
04) 민속놀이의 종류
전통문화란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서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민족의 전통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오래 유지된 것이어야 하고, 그 민족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 생활양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외래문화라 하더라도 문화가 유입되어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민족 모든 구성원이 소유하게 된 것이라면 그 민족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 <본문 중에서>
------------------------------------------------------------------------------------------------
서정임 선생의 <한 권으로 읽는 전통문화>는 국내에서 생활하는 다문화 가족에게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복식예절, 호칭과 지칭에 대한 이야기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복식예절
복식은 인간 생활의 직접적인 표현인 까닭에 처음에는 그 삶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단순한 목적만을 가졌으나, 차츰 사회생활이 영위되고 여기에 문화가 발달하면서 시대의 사회상과 문화상을 반영하게 되었다.
옷은 사람의 몸을 담는 그릇으로 그 사람이 속한 사회, 생활, 인품 등을 짐작하게 하며, 옷차림과 몸가짐은 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하여 상대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므로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시간 ․ 장소 ․ 상황에 맞게 품위 있고 단정하며 세련되게 입어야 한다.
의복은 나라마다 사상이나 관습 및 풍토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통복장은 위는 저고리(襦)를 입고 아래는 바지(袴)를 입는 유고제(襦袴制)가 기본 틀이다. 여기에 남녀 모두 겉에 덧입는 포(袍)와 여성용으로 치마가 있다. 이 밖에 모자와 신 및 허리띠를 갖춘다. 옷모양은 평면에 곧은선(直線)과 굽은선(曲線)이 결합되며 위와 아래옷으로 나뉘는 상하분리형이다. 입는 법은 머리에 쓰고, 몸에 입고, 발에 신는 삼분구도(三分構圖)를 이루고 있다. 우리 옷은 평면적인 제도법이므로 옷을 만들어 이다가 헤어져서 못 입을 때까지 재생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홑옷 ․ 겹옷 ․ 솜옷을 입으며 바느질과 색채, 소재 등으로 다양한 의생활문화를 이루어 왔다.
현대는 국제화 시대로 서양에서 발달한 양복과 양장이 가장 편리한 복장으로 공통화 되는 추세에 있지만 우리나라 한복은 민족의상으로 명절이나 가정의례 등에 입는 예복으로 오랜 전통을 지키면서 정착되고 있다.
호칭과 지칭
호칭이란 어떤 사람을 직접 부르는 말이고, 지칭이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쓰는 말인데 둘 모두를 말할 때는 칭호(稱號)라 한다.
① 자기에 대한 칭호
- 저 ․ 제: 웃어른이나 여러 사람에게 말할 때
- 나: 같은 또래나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 우리 ․ 저희: 자기 쪽을 복수로 남에게 말할 때
② 부모에 대한 칭호
- 아버지 ․ 어머니: 자기의 부모를 직접 부르고 지칭하거나 남에게 말할 때
- 아버님 ․ 어머님: 남편의 부모를 직접 부르고 지칭하거나 남에게 말할 때
- 아빠 ․ 엄마: 말을 배우는 아이가 자기의 부모를 부르고 말할 때
- 가친(家親) ․ 자친(慈親): 자기의 부모를 남에게 말할 때와 한문식으로 지칭할 때
- 춘부장(椿府丈) ․ 자당님(慈堂님): 상대방의 부모를 한문식으로 말할 때
- 부친(父親) ․ 모친(母親): 남에게 다른 사람의 부모를 말할 때
- 현고(顯考) ․ 현비(顯妣): 축문이나 지방에 돌아가신 부모를 쓸 때
- 선친(先親) ․ 선고(先考) ․ 선비(先妣): 남에게 자기의 돌아가신 부모를 말할 때
- 선대인(先大人)선대부인(先大夫人): 상대방의 돌아가신 부모를 말할 때
③ 형제간의 칭호
- 언니: 미혼의 동생이 형을 부를 때 또는 여동생이 여자 형을 부를 때
- 형님: 기혼의 동생이 형을 부를 때
- 형: 집안의 어른에게 형을 말할 때
- 백씨(伯氏): 남의 맏형을 가리킬 때
- 중씨(仲氏): 남의 맏형 이외의 형을 가리킬 때
- 사형(舍兄): 자기의 형을 남에게 겸손하게 일컬을 때
- 사제(舍弟): 자기의 동생을 남에게 겸손하게 일컬을 때
- 얘 ․ 이름 ․ 너: 미혼이나 10년 이상 연하인 동생을 부를 때
- 동생 ․ 자네 ․ 이름: 기혼이나 10년 이내 연하인 동생을 부를 때
- 아우: 동생의 배우자나 남에게 자기의 동생을 말할 때
- 아우님 ․ 계씨: 남에게 그 동생을 말할 때
④ 형제자매의 배우자 칭호
- 아주머니 ․ 형수님: 시동생이 형의 아내를 부를 때
- 아주미 ․ 아지미 ․ 형수: 집안 어른께 형수를 말할 때
- 형수씨: 남에게 자기의 형수를 말할 때
- 계(제)수씨 ․ 수씨: 동생의 아내를 직접 부를 때
- 계(제)수: 집안 어른에게 동생의 아내를 말할 때
- 언니: 시누이가 오라비의 아내를 부를 때
- 올케 ․ 새댁 ․ 자네: 시누이가 남동생의 아내를 부를 때
- 매부(妹夫):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 자형(姊兄): 누님의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직접 부를 때: 새형님, 자형)
- ~서방 ․ 자네: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 매제(妹弟): 여동생의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
- 형부(兄夫): 여동생이 언니의 남편을 부를 때와 말할 때
⑤ 기타 친척간의 칭호
- 할아버지 ․ 할머니: 조부모를 직접 부르거나 남에게 말할 때
- 할아버님 ․ 할머님: 남의 조부모를 말할 때와 남편의 조부모를 부를 때
- 대부(大父) ․ 대모(大母): 자기의 직계존속과 8촌이 넘는 할아버지할머니를 부를 때
- 고모 ․ 고모부: 아버지의 자매 ․ 그 배우자를 부를 때
- 외숙 ․ 외숙모: 어머니의 남자 형제 ․ 그 배우자를 부를 때
- 이모 ․ 이모부: 어머니의 자매 ․ 그 배우자를 부를 때